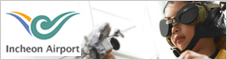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이 흐지부지되는 사이에 극지연구소 거취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를 통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이 7월로 다가왔지만 극지연구소의 미래는 아직 안갯속이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이 흐지부지되는 사이에 극지연구소 거취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를 통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이 7월로 다가왔지만 극지연구소의 미래는 아직 안갯속이다.문제는 지난해 해양과기원법을 공동으로 작업한 교과부와 국토부가 극지연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과기원법 조항은 해양대와 해양연의 부설기관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극지연을 해양과기원 부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교과부의 해석은 다르다. 당초 국토부가 극지연의 명칭까지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했지만 당시 출연연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극지연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을 달고 일반적인 선에서 정의한 조항이라는 것.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출연연 개편안에서 극지연은 다른 17개 출연연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나 출연연 개편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제가 다시 복잡해졌다. 국토부가 극지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기초기술연구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극지연을 해양연에서 분리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 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앞으로 이사회 상정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극지연의 국토부 이관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교과부가 이사회 직전 상정을 자진 철회한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그 배경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사회 직전 청와대에 해양과기원 설립계획을 보고하고, 극지연 거취에 대한 언질을 얻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 안에 대한 보고계획도 있었지만 국토부에 선수를 빼앗겼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극지연이 선수를 치거나 빼앗고 끝날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극지연은 해양연 내부 조직으로 출발해 2004년 부설기관으로 독립했지만 연구 분야는 해양연과 분명히 구분된다. 운영도 독립적으로 해 왔다. 해양연구가 연안과 대양, 심해, 해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극지연구는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극지에서 지구 생성의 비밀과 기후변화, 행성물질 진화, 극지생물, 우주와 천문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바다는 극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현재 극지연 연구의 대부분은 장기 기초연구이고, 국토부 사업 비중은 10%도 채 안 된다. 80% 넘는 연구가 안정적인 출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강원대 등 여러 대학과 협력연구를 하지만 해양대와는 공동 연구과제도 없다.
남극조약 등 국제조약에 따르면서 장기 기초과학ㆍ연구 성격을 띄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해양연구기관과 별도로 극지연구기관을 두고 있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한 울타리 안에 둬 융합연구가 가능케 하고 있다.
독일 알프레드베게너연구소는 헬름홀츠연구회 밑에 우주, 원자력 등 다른 연구기관들과 함께 소속돼 있고, 영국 남극조사연구소도 자연환경연구회 밑에 있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프랑스는 국립과학연구원(CNRS) 산하에 있다. 중국은 특이하게 국토부 산하에 두다 보니 극지연구의 목적에 대해 오해를 자주 산다. 한국까지 그 대열에 낄 필요가 있을까.
장기 계획과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 세계적인 기관들은 연구자가 한 주제만 수년간 파고들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지원한다. 생명, 우주, 소재 등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융합연구도 필수적이다.
극지연구소를 외딴 섬에 가둬서는 안 된다.
- 1 인천시, 여름철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 가동
- 2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 나선다
- 3 인천시립박물관, 강화도 주제로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4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나선다
- 5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 6 인천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조성 나선다
- 7 인천 미추홀도서관, 중장년을 위한 인생 수업 특강 운영
- 8 인천시, 지역 반도체 소부장기업과 글로벌기업 기술 매칭
- 9 인천시, 2025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 10 인천시, 도로 브랜딩으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